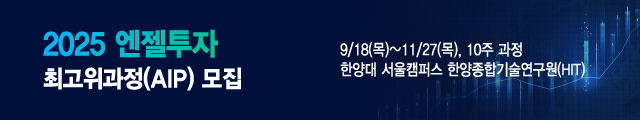[편집자주] 차이 나는 중국을 불편부당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1만명 중에서 가장 뛰어난 6명을 뽑은 두 대학은 다시 영재들을 선발해, 영재교육을 한다. 바로 칭화대의 '야오반'과 베이징대의 '튜링반'이다. 매년 야오반은 50명, 튜링반은 40명을 뽑는다.
인공지능(AI)의 선봉으로 부상한 칭화대 야오반을 보면 중국이 어떻게 천재 교육을 하는지 보인다. 중국 전체 영재의 절반이 칭화대에 모이고, 칭화대 영재의 반이 야오반에 모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야오반은 영재가 많기로 유명하다.
얼마 전 미국 나스닥증시에 상장한 자율주행 업체 포니AI, 안면인식으로 유명한 메그비(Megvii) 창업자가 야오반 출신이며 최근 챗GPT 5.0를 앞선 결과를 내놓은 대형언어모델(LLM) '키미 K2 씽킹'도 칭화대 졸업생이 만들었다.
첸쉐선 문제: "왜 중국 대학들은 걸출한 인재를 배출할 수 없는가?"2005년 중국 로켓 기술의 아버지로 불리는 첸쉐선(1911~2009)은 병문안을 온 당시 원자바오 총리에게 중국 대학 교육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첸쉐선은 상하이교통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항공우주학자로 일하다가 1955년 중국으로 돌아와 탄도 미사일과 로켓을 개발한 인물이다.
그는 "현재 중국이 발전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 인재를 양성할 만한 대학이 하나도 없고 독자적인 것도 없어서 걸출한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큰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
첸쉐선이 제기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중국 교육부는 '기초학과 우수학생 배양 시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엘리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베이징대, 칭화대, 저장대 등 39개 명문대가 기초과학 역량을 평가해 선발하는 '강기'(强基) 계획도 이의 일환이다. 수학, 물리, 화학만 잘해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중국과학기술대학이 1978년부터 일찌감치 '소년반'을 만들어 영재 교육을 시행했고 최근 들어 영재반이 증가하는 추세다(중국 AI 칩 업체 캠브리콘을 창업해, 재산이 33조원에 달하는 천텐스가 소년반 출신이다). 특히 칭화대의 야오반이 최근 눈에 띄는 성적을 내면서 첸쉐선이 지적한 문제를 일부 해결하기 시작했다.

매년 칭화대가 뽑는 신입생은 4000명에 육박하지만, 야오반은 50명밖에 안 뽑는다. 대부분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땄거나 각 성(省) 카오카오에서 상위 3위 이내에 든 인재들이다. 거의 다 추천입학과 수시모집을 통해 입학한다.
2018년 야오반 입학생을 살펴보면 수시 모집이 44명, 정시 모집이 6명이다. 이중 국제수학올림피아드 참가자가 13명(국가대표 3명), 국제정보올림피아드 참가자가 26명(국가대표 3명), 성(省) 이과 1등이 2명이다.
워낙 뛰어난 학생들이 많다 보니, 입학하고 나서 충격을 받는 학생들도 있다. 오픈AI에서 일하다가 2020년 8월 야오반 교수로 임용된 우이 박사가 털어놓은 일화가 재밌다. 그는 2010~2014년까지 야오반에서 학부 과정을 마친 후 2014년~2019년까지 UC버클리에서 박사 학위를 마쳤다.
작년 8월 우 박사는 중국 팟캐스트에서 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는 대회도 참가했고 자신이 꽤 잘한다고 생각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중에 미국인 교수님이 낸 과제를 하는데, 난이도가 엄청 높았거든요. 기숙사에서 하루 종일 풀려고 했지만 도저히 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죠. 그 친구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친절하게도 게임을 멈추고 저를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는 슈팅게임인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중단하지도 않고 펜을 집어 들고 몇 줄 적더니 문제를 풀어줬어요!"
우 박사는 이때 "어떤 사람과 일반 사람과의 지능 차이는 사람과 동물의 지능 차이보다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야오반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이런 좌절감을 느끼기 쉽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덧붙였다.
(만들어 낸 성과를) 진열대에 올리거나 책장에 올리거나중국 영재교육에서 강조하는 말이 "진열대에 올리거나 책장에 올리거나"라는 말이다. 만들어낸 성과를 학문적 성취로 인정받는 것과 상품으로 만드는 걸 대등하게 보는 것이다.

AI 창업 1호 기업으로 꼽히는 메그비는 야오반 출신인 인치와 탕원빈이 2011년 공동 창업했으며 1년 후배인 양무까지 합류했다. 메그비가 개발한 안면인식 시스템은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화웨이 등에 채택됐다.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운영하는 포니AI를 창업한 러우텐청도 유명하다. 야오치즈 교수의 애제자 중 한 명인 러우텐청은 코딩대회인 구글 코드 잼(Code Jam)에서 2년 연속 글로벌 1위를 차지했으며 바이두 코딩 대회에서도 2년 연속 우승한 뒤 바이두에 입사했다. 코딩계에서 러우 교주로 불리던 러우텐청은 2016년 12월 바이두의 수석 아키텍트인 펑쥔과 함께 퇴사한 후 포니AI를 설립했다. 포니AI는 작년 말 미국 나스닥증시에 상장한 데 이어 지난 11월초 홍콩거래소에도 상장했다.
이 밖에도 칭잉의료를 창업한 저우하오, 블록체인 업체 콘플럭스를 세운 롱판, AI 화학업체 싱야오과기를 만든 리청타오, AI업체 타이지그래픽을 설립한 후위안밍 등 야오반 출신 창업자가 부지기수다. 최근 오픈소스 대형언어모델 '키미-K2-씽킹'으로 주목받는 AI 스타트업 문샷 AI를 창업한 양즈린도 야오반은 아니지만, 칭화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이다.
야오치즈 교수는 야오반에서 만족하지 않고 2019년에는 AI 인재 육성을 위해서 '즈반'(智班), 2021년엔 양자컴퓨터 인재 양성을 위한 '양신반'(양자정보반)을 만들었다.

중국 대학들이 세계 과학 기술 연구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Nature)가 발표한 2025 네이처 인덱스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학 중 9곳이 중국 대학이다. 네이처 인덱스는 기초 과학 분야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기여도를 가지고 순위를 산출한다.
미국 하버드대가 1위를 기록했지만 중국과학기술대학이 2위, 저장대가 3위, 베이징대가 4위, 중국과학원대학이 5위, 칭화대가 6위를 차지했다. 또 하버드대는 전년 대비 기여도가 하락한 반면, 나머지 9개 중국 대학은 기여도가 모두 상승했다. 중국의 과학기술 굴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천재 교육에 진심인 중국 대학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다.
- 기자 사진 김재현 전문위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