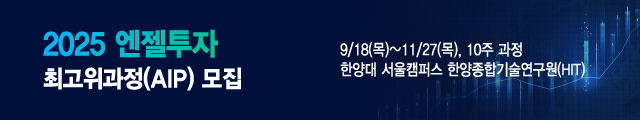2025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한 황철성 서울대 교수
"인간 뇌 모사한 '뉴로모픽 반도체', 미래 AI 산업 핵심"
퇴임까지 4년 반… "나라에 필요한 연구 하고 싶어"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1일 국내 최고 권위의 과학기술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받은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수상 소감을 밝혔다.
황 교수는 "(최고과학기술인상에) 지원서를 내면서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반도체 분야의 중요성을 보고 상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정년 후에도 연구를 이어 나갈 수 있다면 멋있어 보이는 연구가 아닌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연구를 하고 싶다"고 했다.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황 교수는 DRAM(디램) 등 기존 메모리 반도체를 뛰어넘는 새로운 소자와 물질을 발견해 국가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SCI 논문 750편, 국내외 특허 227건, 기술 이전 16건을 달성했다.
정년 퇴임까지 약 4년 반 남은 상황이지만 최근에도 뉴로모픽 반도체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뉴로모픽 반도체는 사람의 뇌 신경을 모방한 차세대 반도체다. 반도체 칩 하나에서 자체적으로 인간의 뇌처럼 사고하고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대량 학습한 후 확률에 기반해 응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불필요하다. 이 때문에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현 AI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핵심 기술로 꼽힌다. 다만 뉴로모픽 반도체가 실제 상용화 수준으로 구현되려면 최소 수년은 걸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황 교수는 "지금처럼 데이터 대량 학습에 기반해 엄청난 자원을 쓰면서 AI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 데이터센터 50곳을 가동하는 데만 전체 전력의 2%를 투입한다. 데이터센터의 수를 무조건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미다. 결국 전력을 적게 쓰는 새로운 반도체를 개발해야 한다"며 "핵심은 뉴로모픽 반도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년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아 (뉴로모픽 반도체를) 끝까지 연구하지는 못할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황 교수는 "연구자의 지식은 계속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정년 연장 시스템이 정착돼있지 않다는 게 정년을 앞둔 많은 연구자의 고민일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황 교수가 재직 중인 서울대는 최근 정년 퇴임한 교수를 재고용해 연구와 후학 양성을 하도록 하는 'SNU 펠로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하고 싶은 연구가 아닌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연구를 먼저 하고 싶다"고 했다.
황 교수는 "내가 (연구자로서) 하고 싶은 연구를 할 만큼 우리나라가 넉넉한 상황인지에 대해 고민한다. 한국은 한동안 HBM 등 메모리 반도체로 돈을 벌었지만, 최근 중국과 미국의 추격이 매우 매섭다. 이대로라면 한국이 먹고살 것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크다"며 "뉴로모픽 반도체가 구현되기 전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꼭 필요할 것이기에, 내가 앞으로 10~15년 더 연구할 수 있다면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후학에게 길을 터주고 싶다"고 했다.
황 교수는 오는 9일 열리는 '2025 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 개회식에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받는다. 수상자에게는 대통령 상장과 함께 상금 3억원이 주어진다.
관련기사
- 기자 사진 박건희 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